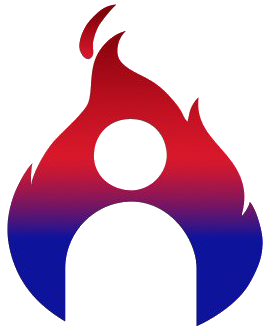<p data-ke-size="size16"><b><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-시민사회 토론회> 발제문</b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 data-ke-size="size18"><b><span style="color: #006dd7;">정치개혁이냐, 개악이냐의 갈림길에서</span>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 data-ke-size="size16"><b><span>- </span><span>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으로 나아가야 </span><span>-</span></b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하승수</span><span>(</span><span>변호사</span><span>)</span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1. </span><span>현행 선거제도와 </span><span>2020-2023</span><span>년의 경과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</span><span>. 2020</span><span>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</span><span>(</span><span>민주당</span><span>, </span><span>바른미래당</span><span>, </span><span>민주평화당</span><span>, </span><span>정의당</span><span>)</span><span>간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극렬 저항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이다</span><span>. <</span><span>표의 등가성</span><span>></span><span>을 개선하고 거대양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깨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심지어 국회를 점거하고 난동 수준의 폭력행사까지 했었다</span><span>(</span><span>패스트트랙 국회 난동사건</span><span>)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span>또한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했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래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하게 설명하면</span><span>, </span><span>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의 </span><span>50% </span><span>정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가령 </span><span>300</span><span>석의 국회의석이 있고 </span><span>A</span><span>정당이 </span><span>10%</span><span>의 정당득표를 하고도 </span><span>1</span><span>석의 지역구 의석도 내지 못한다면</span><span>, 300</span><span>석 </span><span>× 10% × 0.5 = 15</span><span>석을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</span><span>(</span><span>실제 계산은 각 정당의 득표율과 위성정당 창당 여부에 따라 더 복잡하며</span><span>, 2020</span><span>년 총선의 경우에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제도개혁의 효과가 없었음</span><span>)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한편 </span><span>2020</span><span>년 총선의 경우에는 </span><span>47</span><span>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</span><span>30</span><span>석만 준연동형 계산방식을 적용한다는 상한</span><span>(</span><span>캡</span><span>)</span><span>이 있었으나</span><span>, </span><span>부칙에 있던 그 조항은 </span><span>2020</span><span>년 총선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</span><span>, </span><span>현행 제도는 상한</span><span>(</span><span>캡</span><span>)</span><span>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따라서 법개정과 관련해서 거대양당간에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노딜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이 된다면</span><span>, 2024</span><span>년 총선은 상한</span><span>(</span><span>캡</span><span>)</span><span>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게 된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</span><span>2020</span><span>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</span><span>, </span><span>과거의 병립형</span><span>(</span><span>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거대양당에게 소수의 비례대표 의석마저 추가 배분하는 제도</span><span>) </span><span>보다는 비례성</span><span>(</span><span>표의 등가성</span><span>)</span><span>을 향상시키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거대양당 구조를 완화시키며 다당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span>병립형 제도가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가져가야 할 비례대표 의석</span><span>(</span><span>비유하자면 골목상권</span><span>)</span><span>마저도 거대정당이 뺏아가려는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승자독식 플러스 알파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의 제도라면 준연동형은 비록 반쪽짜리이기는 하지만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실현하려는 제도인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2020</span><span>년 </span><span>– </span><span>2023</span><span>년 사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도 </span><span><</span><span>표의 등가성</span><span>></span><span>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었다</span><span>. 300</span><span>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</span><span>(</span><span>덴마크</span><span>ㆍ</span><span>스웨덴 방식</span><span>)</span><span>로 전환하든지</span><span>, </span><span>의석을 늘려서라도 독일식 연동형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든지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</span><span>, </span><span>그러나 이런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결국 </span><span>2023</span><span>년 국회 전원위원회와 </span><span>500</span><span>인 공론조사까지 거쳤으나</span><span>, </span><span>선거법 협상은 거대양당의 밀실 협상으로 넘어갔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리고 국회 안팎에서는 거대양당이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병립형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야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개악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라도 유지가 되지만</span><span>, </span><span>개악을 한다면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퇴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지난 </span><span>11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6</span><span>일에는 보수</span><span>-</span><span>진보 시민사회단체들</span><span>(</span><span>범시민사회단체연합</span><span>, </span><span>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</span><span>, </span><span>주권자전국회의</span><span>, </span><span>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</span><span>)</span><span>이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밀실야합 선거제 퇴행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이 기자회견에서 보수</span><span>-</span><span>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</span><span>, </span><span>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또한 소수정당들도 선거제도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 뿐만 아니라</span><span>, </span><span>민주당 내에서도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지난 </span><span>9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14</span><span>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</span><span>55</span><span>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또한 </span><span>11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15</span><span>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</span><span>30</span><span>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- </span><span>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국민의 힘은 병립형으로 퇴행하려는 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권역별 병립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러나 전국을 </span><span>3</span><span>개 권역으로 나누는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권역별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은 권역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방안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span>결국 지금 핵심은 현행 준연동형 제도라도 지키느냐 거대양당의 독과점 기득권을 강화시킬 과거의 병립형으로 퇴행하느냐의 문제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2. </span><span>세 가지 질문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이 시점에서 세 개의 질문을 던져 본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던지는 질문이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세 번째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1> ‘</span><span>국민과의 약속</span><span>’</span><span>과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국힘과의 야합</span><span>’ </span><span>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</span><span>?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</span><span>, </span><span>아니면 국힘과 야합을 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지난 </span><span>2022</span><span>년 대선 직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</span><span>, </span><u><span>‘</span></u><u><span>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</span></u><u><span>. </span></u><u><span>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</span></u><u><span>------ </span></u><u><span>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</span></u><u><span>, </span></u><u><span>성별</span></u><u><span>, </span></u><u><span>계층</span></u><u><span>, </span></u><u><span>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</span></u><u><span>’</span></u><span>라고 약속했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리고 민주당은 </span><span>2022</span><span>년 </span><span>8</span><span>월 </span><span>28</span><span>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</span><span><</span><span>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</span><span>></span><span>을 </span><span>93.72%</span><span>의 찬성율로 통과시키기도 했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민주당이 이렇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비례성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런데 앞으로 더 나아가지는 못 할지언정</span><span>, </span><span>거대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할 병립형으로 퇴행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초지일관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기득권 지키기</span><span>’</span><span>만을 주창해 온 국힘과 야합하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민주당 지도부는 선택을 해야 한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</span><span>? </span><span>아니면 국힘과 야합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할 것인가</span><span>?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2> </span><span>촛불의 성과를 지킬 것인가</span><span>, </span><span>촛불 이전으로 퇴행할 것인가</span><span>?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2018</span><span>년</span><span>-2019</span><span>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촛불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다</span><span>. 2016</span><span>년 가을부터 일어난 촛불의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</span><span>2017</span><span>년 </span><span>5</span><span>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러나 촛불은 단지 정권교체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세월호 참사와 촛불 당시에 나왔던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국가는 어디에 있었나</span><span>’, ‘</span><span>이게 나라냐</span><span>’</span><span>라는 말속에는 기존의 정치와 국가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속에는</span><span>, </span><span>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</span><span>, </span><span>새로운 국가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렇기에 촛불 이후의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과 같은 과제가 논의되었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선거제도 개혁이 헌법개정의 전제조건 내지 동행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</span><span>2018</span><span>년 </span><span>3</span><span>월에 발의했던 헌법개정</span><span>(</span><span>안</span><span>)</span><span>에서도 </span><span>“</span><span>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</span><span>”</span><span>는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비례성의 원칙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헌법개정이 좌절된 상황에서</span><span>, 2019</span><span>년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던 </span><span>4</span><span>당이 협상을 통해 준연동형이라는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</span><span>.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런데 선거제도를 촛불 이전의 병립형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단지 선거제도만 퇴행시키는 것이 아니라</span><span>, </span><span>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촛불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3> </span><span>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할 것인가</span><span>? </span><span>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킬 것인가</span><span>?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2024</span><span>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구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선거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윤석열 정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</span><span>, </span><span>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무능함과 무책임</span><span>, </span><span>그리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적인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과반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것이 병립형 퇴행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</span><span>, </span><span>최근 논의되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것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이준석</span><span>-</span><span>유승민은 비록 여당 소속이지만</span><span>, </span><span>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나름대로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물론 이준석</span><span>-</span><span>유승민 신당이 등장할지</span><span>, </span><span>얼마나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또한 과거 자민련</span><span>, </span><span>친박연대 등의 사례를 보면</span><span>, </span><span>결국 이들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들 거대 보수정당으로 다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</span><span>(</span><span>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것이다</span><span>)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</span><span>, </span><span>정권심판을 위한 선택이 반드시 민주당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더구나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힘과 야합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의 큰 그림과 내년 총선에서 필요한 정권심판의 과제를 연결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이것은 민주당에게도 필요하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다른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단지 정권심판만이 아니라 정치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변화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</span><span>?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변화의 큰 그림은 </span><span>1> </span><span>실질적 다당제가 실현되어서 정치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정치로 유능해지는 것</span><span>, 2> </span><span>그리고 현행 헌법이 낳고 있는 권력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국민들은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원한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거대양당이 상대방의 실패에 의존하는 양당구도를 지긋지긋해 하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거대양당이 제대로 된 정책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해도</span><span>, </span><span>정치의 세계에서 제대로 된 경쟁구조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다당제 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</span><span>, </span><span>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</span><span>, </span><span>거대양당의 개혁을 촉진한다는 의미도 갖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다당제가 되면 거대양당도 더 이상 상대방의 실패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기 어렵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복수의 경쟁대상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정책경쟁이 치열해지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그것을 통해 정치 전체가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국민들은 직관적으로 그런 다당제 구조를 원하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또한 국민들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원한다</span><span>.</span><span> 1987</span><span>년 이후 헌법을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낙후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위험도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당장 지난 대통령선거 때 다수의 국민들이 거부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는가</span><span>(</span><span>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</span><span>48.56%</span><span>였다는 것을 기억하자</span><span>)?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</span><span>, </span><span>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</span><span>1</span><span>차적인 과제로 정치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래야만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독선과 전횡</span><span>, </span><span>민생외면</span><span>, </span><span>시대적 과제에 대한 외면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과도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리고 헌법개정과 이를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</span><span>, </span><span>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</span><span>, </span><span>감사원 국회 이관</span><span>, </span><span>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이뤄내려면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연합정치</span><span>’</span><span>가 필수적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헌법개정이 연합정치 없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국회의원 </span><span>3</span><span>분의</span><span>2 </span><span>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헌법개정이기 때문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연합 정치는 선거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새로운 헌법</span><span>, </span><span>새로운 국가시스템을 만들려면 연합정치가 필요하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</span><span>, </span><span>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여러 정당들간의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일종의 연합정치</span><span>’</span><span>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지금 대한민국에는 제도개혁을 위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당면한 선거와 관련된 연합정치는 필자가 얘기할 영역이 아니므로</span><span>, </span><span>제도개혁을 위한 연합정치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겠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이번에 병립형으로의 선거제도 퇴행을 막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의 정치변화에 대한 기대와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래야 단순한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현행 유지</span><span>’</span><span>가 아니라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미래를 위한 변화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따라서 민주당과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이 준연동형 유지와 함께</span><span>, ‘</span><span>정치제도 개혁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에 뜻을 모으면 좋겠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이 점은 민주당 지도부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진보</span><span>, </span><span>개혁을 표방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지금 시점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가능하다면 과거로 퇴행하지 않는 것과 함께</span><span>, 2024</span><span>년 총선 이후에 구성될 </span><span>22</span><span>대 국회에서 실현할 정치개혁의 밑그림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합의해내는 것이 필요하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조항 신설을 추진한 후에</span><span>, 22</span><span>대 국회 구성과 함께 제도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물론 </span><span>22</span><span>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치제도 개혁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가칭</span><span>)</span><span>범국민정치개혁기구</span><span>’</span><span>를 구성하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헌법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가칭</span><span>)</span><span>헌법개정시민회의</span><span>’</span><span>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</span><span>2026</span><span>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특정지역의 일당지배구조를 깨고</span><span>, </span><span>지방자치도 개혁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헌법개정을 통해서는 </span><span>2027</span><span>년 대통령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보다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그 속에서 다양한 지향과 정책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경쟁하면서 시대적 과제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따라서 한국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 제도개혁일 수밖에 없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다수 국민들도 더 이상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영웅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이 나타나서 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지금 필요한 것은 </span><span>‘</span><span>한 사람의 영웅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이 아니라</span><span>, ‘</span><span>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유능해지고 부패없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</span><span>’</span><span>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것이 정치개혁의 진정한 비전이다</span><span>. </span><span>그리고 이것이</span><span>, </span><span>국가운영에 대한 비전없이 총체적인 실정과 난맥상</span><span>, </span><span>독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2024</span><span>년 총선이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이 일어나는 선거가 되길 기원한다</span><span>. </span></p>
<p style="text-align: left;" data-ke-size="size16"> </p>
<p style="text-align: left;" data-ke-size="size16"><span>원문 보기</span><span></span></p>
<p><figure class="fileblock" data-ke-align="alignCenter"><a href="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I3wwv/btsCc5D2lHc/T2zaTy7lZiqQ6J7Egk5EXK/%5B%EB%B0%9C%EC%A0%9C%EB%AC%B8%5D%ED%95%98%EC%8A%B9%EC%88%98.hwp?attach=1&knm=tfile.hwp" class="">
<div class="image"></div>
<div class="desc"><div class="filename"><span class="name">[발제문]하승수.hwp</span></div>
<div class="size">0.04MB</div>
</div>
</a></figure>
</p>